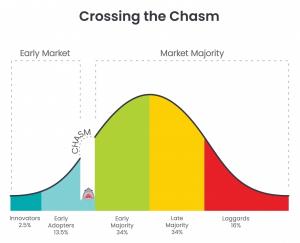멀게만 느껴지던 녀석이 불쑥 찾아와 내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에요. 챗GPT(ChatGPT)가 보여준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상이 딱 그렇죠. 분명히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지던 기술이었는데, 갑자기 피부에 와 닿는 느낌. 경이로움을 넘어 두려울 정도네요.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이니, 두 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0만 명을 넘겼겠죠.
챗GPT와 두어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가 목매었던 ‘검색’이라는 행위가 갑자기 굉장히 원초적으로 느껴졌어요. 조 단위, 아니 경 단위의 데이터를 학습한 지능 앞에서 우리의 검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득 ‘이제는 좋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질문의 수준을 올릴 때마다, 챗GPT가 내놓는 대답은 훨씬 세련미를 더했죠. 마치 기계와 경쟁이라도 하듯, 더 좋은 질문을 짜내느라 애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 정도라면, 진짜로 문학을 하고 논문을 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대신 질문의 밀도에 따라 결과물의 완성도가 결정되겠죠. 어쩌면 미래 시대의 경쟁력은 질문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Sub. 1 질문하는 능력 왜 중요한가?
필자는 사회초년생 시절 모 전문지 기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호텔이나 외식 같은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분야를 다루는 잡지였죠. 초반에는 업계를 잘 몰랐어요. 호텔 총지배인이나 수석 셰프 같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 7할이 모르는 용어였을 정도죠.
그런데 말끝마다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구차하게 되묻느니 대충 아는 척하며 넘기는 쪽을 택했어요. 집요하게 질문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작성된 기사들을 지금 보면 얼굴이 화끈거길 정도에요. 길고 장황한데다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니 가독성이 최악이죠.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들 정도에요. 읽히지 않는 글이라…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기사가 그 지경이 된 이유는 뻔합니다. 쓰는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인터뷰 흉내만 냈을 뿐, 인터뷰 대상의 답변이 독자에게 유의미한지 판단하지 못했어요. 답의 모양을 갖췄지만, 정답은 아니었던 거죠.
질문이 정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면, 좋은 질문일수록 더 튼튼하고 촘촘한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자 IBM의 창업자이기도 한 토머스 존 왓슨은 “적절한 질문을 할 능력이 있다면, 절반 이상의 답은 찾아내고 시작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죠. 질문 자체가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셈이에요.
소통의 측면에서도 질문은 중요한 무기에요. 효과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북돋죠. 우린 누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소통을 시도하지만, 누구나‧어디서나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통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문제나 부작용들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질문만 잘해도 불통의 덫에서 꽤나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상대를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드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 껍질을 깨는 각성제로 기능하기도 해요. 좋은 질문은 내재된 잠재력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와도 같죠. 상대방의 태도를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줘요.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도 매일 아침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허물어 낸 것이죠.